카테고리 없음
[스페인 문화기행] ③ 사랑을 만드는 드라마의 도시 코르도바
눌재상주사랑
2011. 10. 13. 10:09
[스페인 문화기행] ③ 사랑을 만드는 드라마의 도시 코르도바<세계일보>
- 입력 2011.10.12 (수) 20:23, 수정 2011.10.13 (목) 05:51
관련이슈 :스페인 문화기행
43도 태양 아래 붉은 셔츠를 입은 무희의 춤… 마룻바닥을 향해 내리치는 구두 뒷굽소리는 심장을 후려쳤다
무희의 눈빛은 사랑의 모든 고뇌를 간직한 듯… 사랑만 하기도 모자란 인생, 가슴 터지도록 사랑하라!
무희의 눈빛은 사랑의 모든 고뇌를 간직한 듯… 사랑만 하기도 모자란 인생, 가슴 터지도록 사랑하라!
201110120044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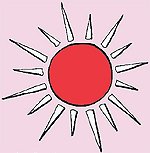 코르도바로 가는 길은 내내 황무지이다. 간혹 강한 햇빛을 벗 삼은 올리브 나무가 숲을 이루어 메마른 대지를 위로하고 있다. 올리브나무를 보면서 코르도바 사람들이 왜 열정적인가 하는 의문이 쉽게 풀렸다. 그들은 술을 마실 때 올리브를 안주 삼고, 식사를 할 때도 올리브를 반찬으로 먹는다. 모든 요리에는 올리브기름이 들어간다. 강렬한 태양의 빛을 머금고 메마른 대지의 기운을 빨아들인 올리브를 먹으면서, 그들은 춤을 추고 손뼉을 친다. 삶이 열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코르도바로 가는 길은 내내 황무지이다. 간혹 강한 햇빛을 벗 삼은 올리브 나무가 숲을 이루어 메마른 대지를 위로하고 있다. 올리브나무를 보면서 코르도바 사람들이 왜 열정적인가 하는 의문이 쉽게 풀렸다. 그들은 술을 마실 때 올리브를 안주 삼고, 식사를 할 때도 올리브를 반찬으로 먹는다. 모든 요리에는 올리브기름이 들어간다. 강렬한 태양의 빛을 머금고 메마른 대지의 기운을 빨아들인 올리브를 먹으면서, 그들은 춤을 추고 손뼉을 친다. 삶이 열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43도를 웃도는 코르도바의 미친 햇볕은 인간을 광기(狂氣)가 아닌 선(善)의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었다. 햇빛은 소리가 되었고, 햇살은 춤이 되었다. 코르도바의 태양은 그렇게 격정적일 수밖에 없는 플라멩코를 만들어 낸 것이다. 바로 태양 때문이었다. 카뮈의 ‘이방인’에서 뫼르소는 강한 햇빛 때문에 살인을 했다고 한다. 살인의 이유가 단지 햇빛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타인은 물론 자기 자신에게조차 이방인으로 비쳐진 것이 살인의 또 다른 이유였는지도 모른다.
카뮈의 ‘이방인’에서 뫼르소는 강한 햇빛 때문에 살인을 했다고 한다. 살인의 이유가 단지 햇빛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타인은 물론 자기 자신에게조차 이방인으로 비쳐진 것이 살인의 또 다른 이유였는지도 모른다.
코르도바로 발을 들여 놓는 순간 ‘이방인’이 떠올랐다. 거리는 고요했다. 사람들이 바캉스를 떠났는지 도시 전체가 텅 비어 있었다. 관광객도 보이질 않는다. 낮잠을 즐기는 시에스타의 시간도 아닌데 도로를 누비는 차도 거의 볼 수 없다. 햇빛을 피해 골목길을 들어가도 마찬가지다. 코르도바는 우리들을 이방인으로 만드는 재주를 가진 것 같았다. 할 수 없이 호텔로 발걸음을 옮겼다.
코르도바의 한낮은 저녁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는 깊은 휴식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했다. 해는 쉽게 떨어질 것 같지 않았다. 하루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냥 밖으로 나갔다. 이슬람은 물론 유대인의 흔적이 곳곳에서 보인다.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한 구획 안에 유대인을 가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형성된 삶의 여러 흔적들이 관광객의 발길을 잡는다. 붉은 꽃들로 장식된 유대인 거리의 발코니 사이로 보이는 성당의 탑이 마음을 숙연하게 만든다. 그늘진 골목에서 보이는 하늘은 유달리 파랗게 보이고, 건물의 흰 벽도 유난히 하얗게 보인다.
스페인 사람들이 지닌 관용의 정신은 인간의 마음뿐 아니라 눈도 즐겁게 해주는 재주를 가진 것 같았다. 유대인 거리를 빠져나오니 여느 관광지처럼 선물가게가 발길을 멈추게 한다. 이슬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인지 세라믹으로 만든 장식품들이 많았다. 액자뿐 아니라 사랑하는 연인의 이름 알파벳을 세라믹에 새긴 상품도 있다. 세라믹의 내구성을 닮은 ‘천년의 사랑’을 하라는 뜻일 게다. 동행한 아내의 영문 이름을 새기려니 아내는 “낯간지럽다”며 무안함을 준다. 고마운 존재다. 복잡다단한 현실에서 아내가 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코르도바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전원도시. 아랍과 유럽풍이 뒤섞인 주택들과 꽃이 어우러진 모습이 인상적이다.
아이쇼핑도 즐거운지라 이 가게 저 가게 다니다 보니 어린아이의 플라멩코 옷이 시선을 끈다. 며칠 뒤면 딸의 돌이기 때문이다. 한복 대신 플라멩코 옷을 입혀보고 싶은 마음에 작은 사이즈를 찾았지만, 그렇게 작은 것은 없다고 한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가게를 나서는데 마침 한 광고가 눈을 번쩍 뜨게 했다. 플라멩코 공연 관람이 30유로다. 그것도 코르도바식 저녁식사와 포도주가 포함된 가격이다. 스페인 물가가 만만치 않는데, 30유로로 코르도바의 저녁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재빠르게 예약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 뒤로 한 테이블만 남아 있었다. 공연은 9시에 시작해서 11시에 끝난다고 한다.
코르도바의 낭만을 기억하라는 듯이 상당히 세련된 기타리스트 조형물이 우뚝 서서 오가는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다.
두 시간 정도 여유가 있어 골목길로 발걸음을 옮기려는데 또각또각 말발굽 소리가 들린다. 힐끗 돌아보니 마부가 귀신같이 알아차리고 마차타기를 권유한다. 장난기가 발동했다. 비싸다고 하니 깎아 준다고 했다. 유학생 시절에는 여유가 없어 탈 엄두가 안 났는데, 놀이하듯이 흥정을 하고 마차에 올랐다. 스쳐지나가는 건물들과 푸른 하늘 그리고 말발굽 소리는 영화의 배경 음악처럼 어느새 우리들을 ‘낭만’과 ‘순수’로 이끌었다.
예전의 술 창고가 지금은 플라멩코 공연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무대와 테이블이 10여개 있는 동굴이었는데, 사실 공연장이라기보다는 어두컴컴한 살롱에서 우리들만의 춤과 음악을 감상하라는 비밀스러운 장소와도 같았다. 자리에 앉자마자 술과 음식이 재빠르게 좁은 테이블을 메웠고, 누가 먼저라고도 할 것 없이 술잔들이 오갔다. 부딪히는 잔 속에서 출렁거리는 포도주는 마치 플라멩코의 예고편을 보여주는 듯했다. 붉은 옷을 입고 플라멩코를 추는 여인의 옷자락이 보였기 때문이다. 취기가 오를 때 두 명의 기타리스트가 자리를 잡으며 연주를 시작했다. 강렬한 태양 아래 강렬하지 않은 것이 없듯이, 기타 그 자체로도 코르도바의 열정을 느끼게 했다. 더구나 붉은 셔츠를 입은 남자 무희의 춤은 우리의 넋을 쏙 빼놓았다. 마룻바닥을 향해 내리치는 구두 뒷굽소리는 심장을 후려치고 있었다. “사랑하기에도 짧은 시간이다.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 이어서 등장한 여자 무희의 눈빛은 사랑의 모든 고뇌를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역시 사랑이다. 고통이 따라도 사랑이 최선이다”라는 주문을 외우는 것 같았다.
술 창고를 개조해 만든 플라멩코 공연장에서 춤과 음악이 흐르고 있다. 플라멩코는 15세기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에 정착한 집시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음악과 춤이다. 안달루시아의 사크로몬테 언덕에는 예전에 집시들이 살았던 동굴이 남아 있다. 술 창고 공연장의 모습이 동굴을 닮았다.  코르도바의 태양은 플라멩코를 만들어 냈고, 플라멩코는 연인들을 유혹에 빠지게 했다. 그렇게 플라멩코는 우리들을 피안(彼岸)이 아닌 차안(此岸)의 세계로 인도하면서 세속적인 사랑, 세속적인 삶이 이상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일깨우려는 것 같았다. 마침 취기가 오른 박 교수가 시를 한 편 읊어댄다.
코르도바의 태양은 플라멩코를 만들어 냈고, 플라멩코는 연인들을 유혹에 빠지게 했다. 그렇게 플라멩코는 우리들을 피안(彼岸)이 아닌 차안(此岸)의 세계로 인도하면서 세속적인 사랑, 세속적인 삶이 이상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일깨우려는 것 같았다. 마침 취기가 오른 박 교수가 시를 한 편 읊어댄다.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 / 모딜리아니의 잔느 / 고갱의 타히티의 여인 / 고흐의 흐느끼는 여인 / …… / 사랑이 낳은 불후의 명작들 // 사랑은 열정을 낳고 예술을 낳고 대가를 낳았다. / 신도 사랑 앞에선 마음을 돌리듯 / 그대 사랑을 하라 / 한 번뿐인 삶 불나비처럼 / 사랑하라 // 가슴이 하는 말, / 사랑하라 / 쉼 없이 사랑하라 / 사랑만 하기도 모자란 인생 / 후회 없이 사랑하라 / 가슴 터지도록 사랑하라!”
일행 중 한 사람이 “오로지 내 앞에 있는 연인만을 생각하자”며 건배를 제의한다. 너 나 할 것 없이 잔은 출렁거리고, 우리들의 가슴 시린 눈빛은 포도주 잔 안에서 춤을 춘다. 플라멩코라는 퍼포먼스의 주인공이 되어 엉덩이를 들썩거린다.
글·사진=정해광(아프리카미술관 관장), 박재현(경남과학기술대학 교수·시인)